2025. 1. 21. 21:56ㆍ산티아고 순례길
2019.4.18.(목), 맑음.
30.3km(766.9km) / 7시간 32분

알베르게 Castro 호스텔에서는 음식 파는 카페 영업을 하면서도 작은 주방을 만들어놓았다. 가난한 순례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대부분 그러하지 않았는데 고마웠다. 참치를 곁들인 라면을 끓였다. 젓가락이 없다고 하자 여종업원이 포크까지 갖다주는 친절에 감동을 받았다. 기분이 좋아져선지 국물 맛이 일품이었다. 동트기 전에 호스텔을 나왔다.

카미노는 호스텔 옆 순례자상 샘터에서 시작됐다. 검푸른 하늘에 뜬 둥근달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려는지 아직 서산을 넘지 않고 머뭇거렸다. 마을 끝 집에 다릿발을 세워 올린 창고가 보였다. 쥐와 습기를 막으려고 세운 ‘오레오horreo’로 불리는 옥수수 저장고였다. 갈리시아 지방에 들어온 후부터 형태가 조금씩 달랐지만, 많이 보였다. 지금은 곡물창고로 사용하기보다는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날이 천천히 밝아왔다. 연한 하늘에는 푸른 구름이, 먼 골짝에는 안개가 가득했다. 공동묘지 탓일까, 자욱한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으스스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고아한 정취에 젖어 들 수 있었다. 문이 굳게 닫힌 알베르게가 나왔다. 벽에 붙여 놓은 큰 조가비 형상이 눈길을 끌었다. 제법 걸은 것 같은데 카미노 사인이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았다. 깜빠냐Campana 마을 표지판이 보였으나 카미노 사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길을 잃으면 가장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상책이다. 되짚어 보니 삼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가야 하는데, 안개에 취해 왼쪽으로 가고 말았다. 음산하긴 했으나 좋은 풍치를 감상했으니 밑진 걸음은 아니었다. 다시 찾은 길은 이끼 옷을 걸친 아름드리나무가 많은 숲길이었다. 두 번 다시 길을 잃지 말라고 등 뒤에서 해님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안개가 거짓말 같이 사라졌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까사노바를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옵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미스 타이완’이 바르에서 달려나왔다. 미스 타이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를 오빠라고 불렀다.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면 서툰 우리말 때문인지 중늙은이의 귀를 간질이는 콧소리를 냈다. 걷는 것도 아이처럼 찬찬히 걸었다. 같은 거리라도 시간을 더 들여야 하루의 여정을 채울 수 있었다. 또다시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후부터는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끔 생각나는 귀여운 친구였다.

다음 마을, 마또의 바르에 들러 얼른 용무를 보고 앞서간 일행을 뒤따랐다. 20여 분 지났을 때 바르 돌담에 모자를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다. 깜박했다. 20여 년을 썬 등산모였는데 몸이 지쳐 찾으러 가지 못했다. 스카프를 모자 대용으로 덮어썼으나 겉멋을 부린 것 같아 멋쩍었다. 레보레이로 산타마리아 성당Iglesia de Santa María de Leboreiro에 다다랐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옥수수를 담는 커다란 망태기가 이채로웠다. 멜리데 복합 상업 단지Parque Empresarial de Melide에 도착했다. 카미노는 상업 단지 앞 잔디밭 사이로 이어졌다. 자동차 판매장, 자동차 수리점, 사무실, 기타 시설이 가지런히 배치된 모습이 말끔한 인상을 주었다.

4개의 아치로 만들어진 로만Roman 다리를 건너 프렐로스 마을에 도착했다. 프렐로스 강을 낀 마을은 크고 세련됐다. 다리 근처에서 까사 무세오Casa Museo라는 작은 박물관이 있었다. 무료입장이었으나 걷는 흐름이 끊일까 들어가지 않았다. 오른쪽의 프렐로스 산 쥬앙 교회Igrexa de San Xoán de Furelos를 통과해 바르에 들어갔다. 주인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게 길러 빨간 주머니 치마를 걸치고 있어 독특해 보였다. 커피 마시고 돌아서다가 우리도 정리하지 않은 턱수염이 어수선하게 돋은 터라 같이 셀카를 찍었다. 주인이 멋진 자기 수염을 보란 듯이 쓰다듬었다.

은근히 계속되는 오르막길을 30여 분 걸어 멜리데 마을에 도달했다. 멜리데는 읍邑 수준이었지만 도시 냄새가 짙었다. 산 로케 성당Capela de San Roque을 만났다. 이 성당은 1949년 기존의 산 페드로San Pedro 성당과 산 로케San Roque 성당을 철거하고 다시 세웠다고 한다. 정문의 멋진 조각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산 페드로San Pedro 성당의 것이다. 카미노 사인을 찾아가며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 산 뻬드로 성당Iglesia de San Pedro과 시청Casa do Concello을 지났다. 마을의 외곽이다. 샘터에는 동백나무가 꽃 잔치를 벌였고 등나무꽃이 자줏빛 수를 놓아 장관을 이루었다. 산티아고까지 남은 거리(52.089km)가 적힌 표지석에도 한 송이 동백꽃이 놓였다.

알리바 마을로 향하는 도로에 한 무리의 남녀 혼성 승마인이 나타났다. 마상에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이 멋졌다. 승마인들도 카미노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숲길에 들어서자, 김상기가 후미자와 사진을 찍었다. 야전잠바를 입고 뒷머리를 질끈 묶은 남자는 숲길에서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주변은 온통 유칼립투스 숲이었다. 카타솔 강Rio Catasol 돌다리가 나왔다. 강이라기보다는 도랑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작고 좁아도 모두 강이라고 통했다. 돌다리가 놓인 개울에서 말들이 피로를 풀려는 듯 물장구를 쳤다.

보엔떼 데 알리바 마을을 지나니 휴식처를 만들어 놓고 몇 가지 상품을 팔고 있는 ‘작은 오아시스el pequeño oasis’가 있었다. 산티아고까지 48km 남은 지점이다. 이곳에서 기념 스탬프를 찍어 준다고 하니 자국(스페인)에서 순례 온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갔다. 알리바 마을을 눈으로 훑으며 빠져나왔다.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살레타 분수가 있었다. 그곳을 지나면 보엔테 마을, 저만치에 하얀 벽의 보엔테 산티아고 성당Iglesia de Santiago de Boente이 보였다. 성당 앞 돌길을 따라가니 조금씩 오르막 졌다.
가스따네다 마을의 바르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일행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 외국인 순례자가 “프렌드가 넘어져 이마를 다쳤다.”라고 알려주었다. 그때까지 황경엽이 도착하지 않았다. 손명락과 김상기가 황급히 배낭을 벗어놓고 달려갔다. 한참 뒤에야 세 명이 바르에 들어왔다. 황경엽이 이마에 거즈를 붙였다. 보엔테 산티아고 성당 앞 돌길에서 넘어져 왼쪽 눈썹 위가 찢어졌다. 요행으로 순례자 중에서 스페인 여의사가 있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다른 부상은 없어 놀란 가슴이 진정됐다. 바게트로 점심을 먹는데 여의사 일행이 들어왔다. 여의사가 “응급처치만 했으니 큰 마을에 도착하면 병원 가서 봉합하라.”고 일러주었다. 황경엽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 오렌지주스 두 잔을 선사했다. 하얀 거즈를 붙인 그의 얼굴이 기운 없어 보였다.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한 시간을 걸어 리바디소 데 바이호 마을에 도착했다. 목가적인 마을 풍경이 평화로웠다. 여기서부터 아르수아까지 3km에 걸쳐 힘든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순례자가 마을 앞 이소 강변에 발을 담근 채 피로를 풀고 있었다. 우리도 휴식하고 두 시가 넘어서야 아르수아 마을에 발을 디뎠다. 마을 입구에서 중심부까지는 1km가 조금 넘었다. 현대식 마을이었다. 인도에 설치된 재활용품 수집시설이 이채로웠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점에서 모자부터 사고 인근의 사설 알베르게에 여장을 풀었다. 일행들의 빨랫감을 전기세탁기에 넣어 돌린 후 건조기에 말렸다. 여주인이 다 마른 세탁물을 차곡차곡 개켜 주었다.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알베르게의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료는 따로 낸다. 4~5유로씩 해도 편해서 좋았다. 경비를 아끼려고 일행의 빨랫감을 한데 모아 세탁한다. 세탁하는 동안 황경엽은 병원에 다녀왔다. 함께 가려고 했지만 “살아남는 연습”을 한다며 혼자 갔다. 상처를 봉합하고 돌아와 “의사가 세 바늘 꿰맸고, 일주일 후 실밥을 빼라”고 했다며 “치료비는 무료고 3일 치 소염제 약값만 주었다”고 했다. 치료비가 왜 무료냐고 물었으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치료를 무사히 마쳐 안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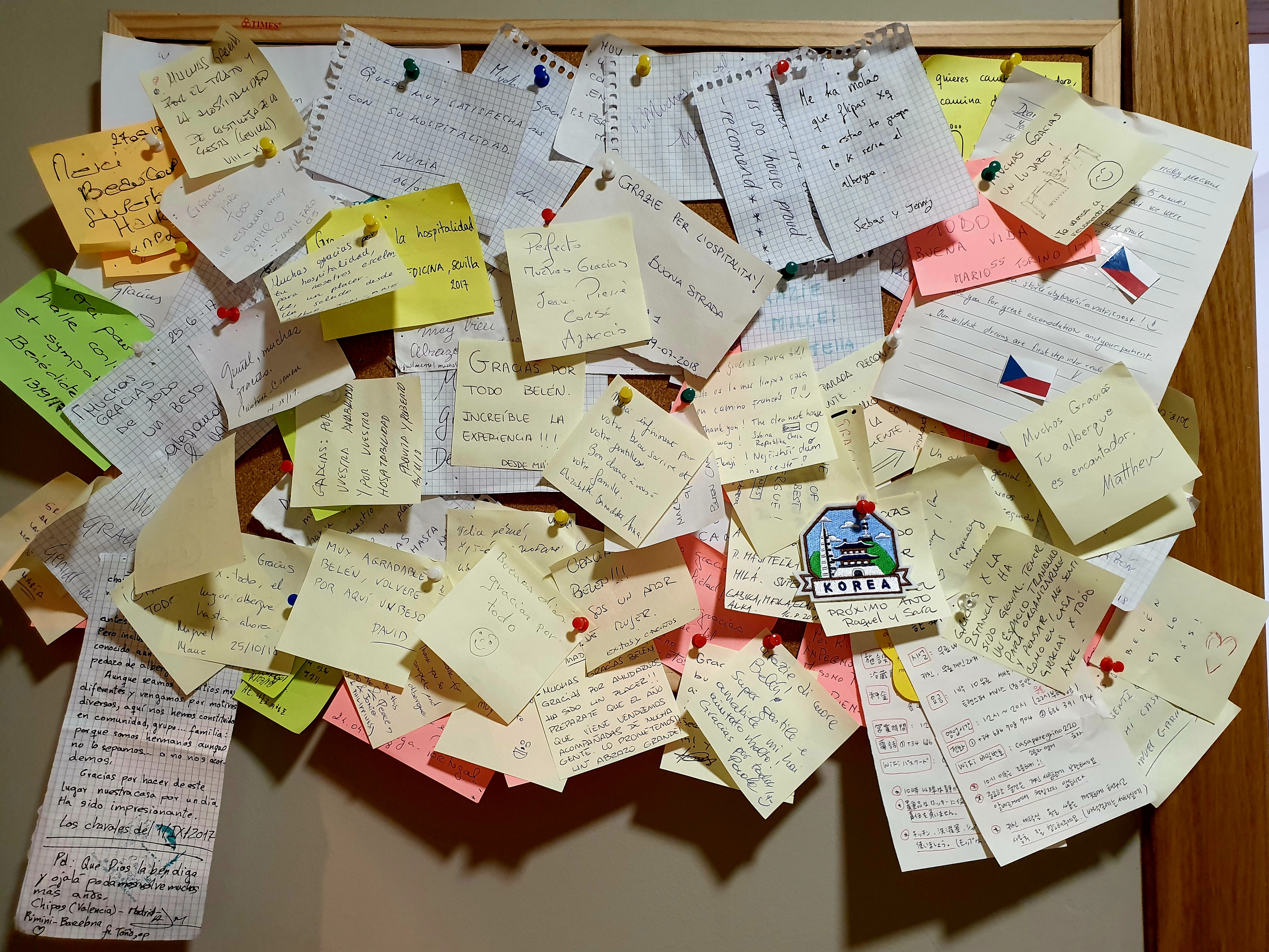
우성현이 우리가 든 알베르게에 왔고, 뒤늦게 정재형, 김○주, 최인규가 들어왔다. 한국인들과 우연한 만남이 또 이루어졌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려고 마켓에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공교롭게 마켓이 모두 문을 닫았다. 부활절을 앞둔 연휴라고 했다. 문을 연 정육점에는 염장한 쇠고기밖에 없었다. 그래도 샀다. 장래 희망이 셰프인 최인규가 저녁을 지었다. 쉽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주는 게 고마웠다. 쇠고기는 짰지만, 쌀뜨물 숭늉은 그만이었다. 고향의 맛이었다. 다른 알베르게에 혼자 등록한 김효겸도 찾아와 화기애애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산티아고 순례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1 DAY | 오 빼드로우소 > 산티아고 데 꼼뽀스텔라(완주) (0) | 2025.01.24 |
|---|---|
| 30 DAY | 아르수아 > 오 빼드로우소 (0) | 2025.01.23 |
| 28 DAY | 뽀르또마린 > 빨라스 데 레이 (0) | 2025.01.21 |
| 27 DAY | 사리아 > 뽀르또마린 (0) | 2025.01.18 |
| 26 DAY | 뜨리아까스텔라 > 사리아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