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8. 23:32ㆍ입맛
음식과 술맛이 제아무리 좋아도 함께 먹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꼬장꼬장한 상사가 주도하는 회식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도 미각을 만족시키려면 소통이 잘되고 취향이 맞는 친구가 좋다. 오랜만에 존경하는 선배 형을 모시고 벗과 셋이 석양배하려고 <교동 생고기> 집에 갔다. 처음 가는 식당이었다. 홀이 길쭉해 한쪽을 조금 높게 만든 2단이었는데 스타일이 괜찮았다. 두셋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고 우리는 단이 높은 쪽의 창가에 앉았다. 정자살창을 보니 식당을 수리한 지 오래되진 않은 거 같았다.
이모에게 생고기 大짜와 참(소주)을 주문했다. 곧바로 밑반찬으로 간처녑과 번데기, 다슬기 등을 내왔다.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었다. 번데기를 몇 개 집어 먹다 다슬기를 쪽쪽 빨았다. 추억을 떠올려 옛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번데기는 보기와 다르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지만, 수입 과정의 방부제 논란이 따른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다슬기는 빼먹기 좋게 밑부분이 으깨져 있었다. 생고기가 뭉텅이로 썰어져 나왔다. 양이 많았지만 완전히 찰지진 않았다. 기름장과 두부가 따라왔다. 기름장은 참기름과 마늘, 다진 양념이 어울려 고소하고 매콤했다. 구운 두부는 뜨뜻하고 구수해 생고기만큼 입맛을 당겼다. 잡담하고 술 마시는 동안 서비스 안주가 나왔다. 고딧국이 먼저 나오고 오징어와 새우튀김이, 콩나물과 무나물이, 수삼과 마요네즈가 천천히 차례로 나왔다. 장삿집이 손해 안 나려는지 살짝 마음이 쓰였다.
안주가 예스러웠기 때문일까? 잡담이 자연히 옛날로 흘러갔다. 취기가 없어도 술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었다. 어릴 적 시골의 에피소드가 쏟아져 서로 맞장구치고 훈수하며 박장대소했다. 압권은 친구가 꼬마였을 때 한여름 밤, 개울에서 목욕하는 형수와 누나들에게 손전등을 비춘 것이었다. 혼비백산한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 철없었지만 정겨웠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2024.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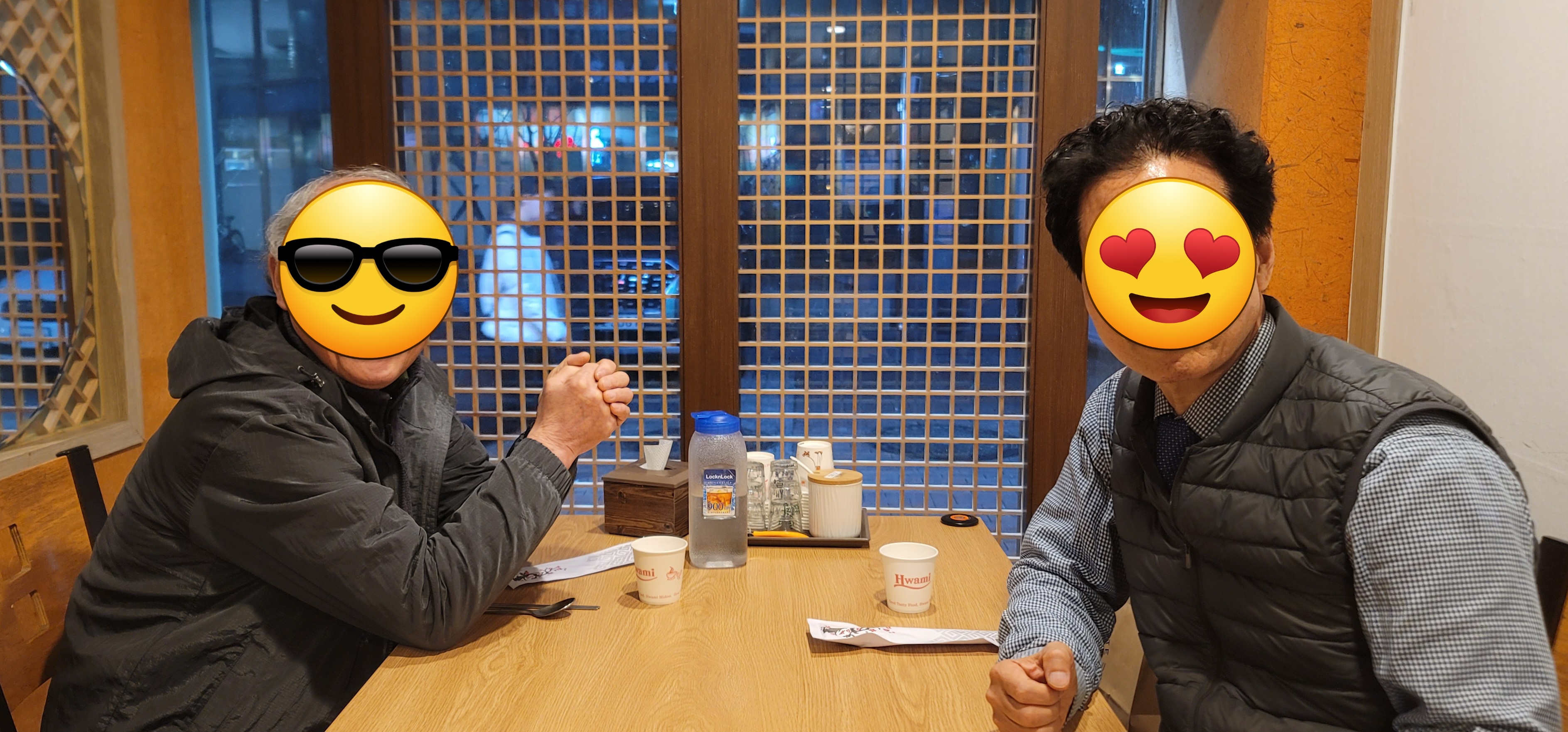



'입맛'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화축산 한우 국밥 (103) | 2024.04.04 |
|---|---|
| 술 낚시와 좌쌈우주 (92) | 2024.04.02 |
| 중화요리 집 옥성루 (116) | 2024.03.27 |
| 팔공산 가는 길의 다모아식당 (121) | 2024.03.25 |
| 집에서 도다리쑥국을 (109) | 2024.03.24 |